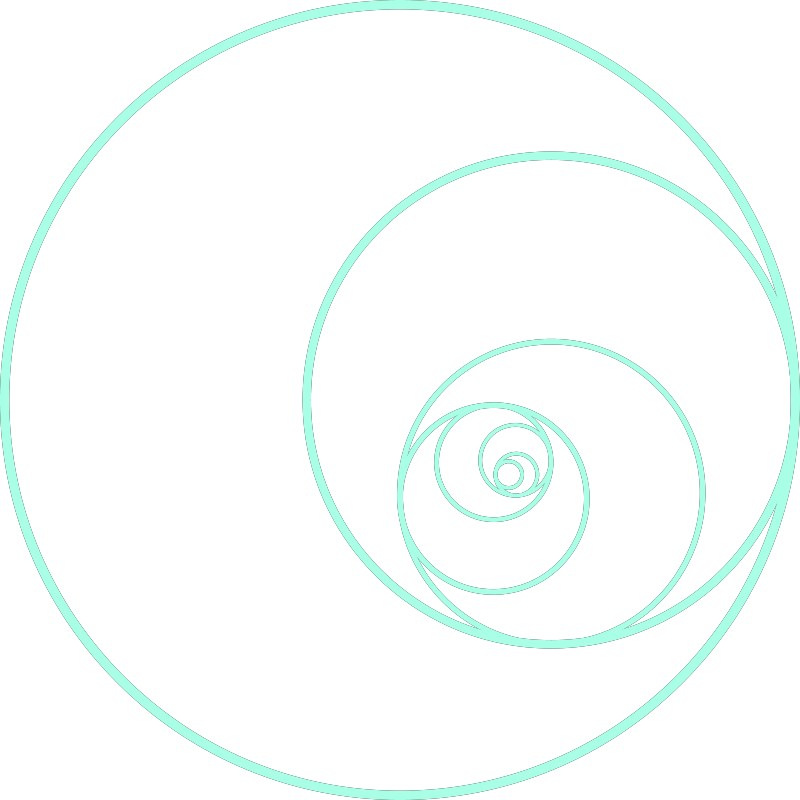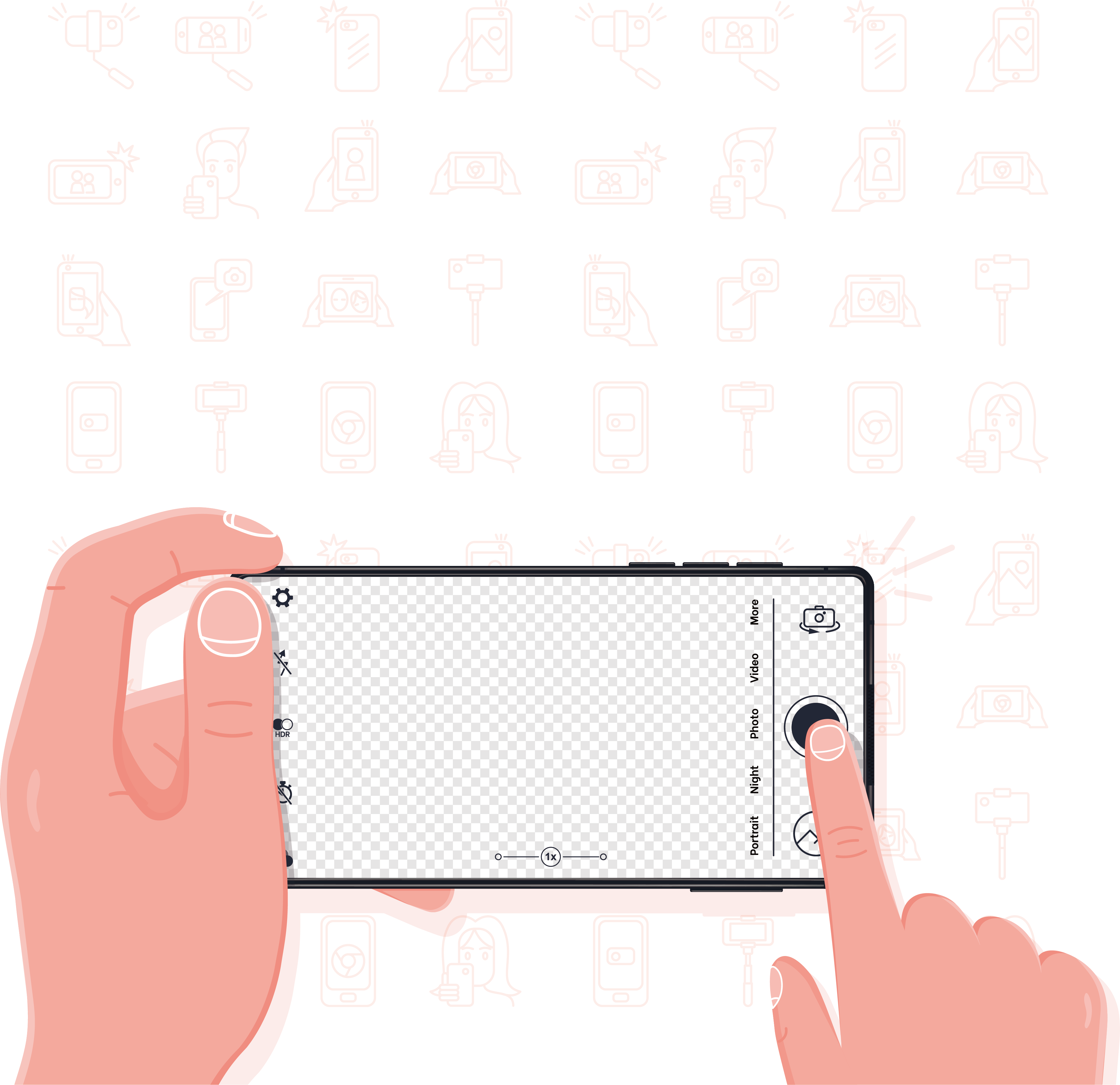- 일시: 2024년 4월 6일(토) ~ 7일(일)
배경 음악이 재생 중입니다.
누구나 여행을 할 때 경험하는 것이 하나는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겠지만, 여행지에서 물 때문에 나타나는 배앓이가 있다. 이번에 미국 동부지역의 보스턴 근교에서 6개월 정도 머물게 되었다. 이곳에 사는 딸네 집을 중심으로 뉴잉글랜드 지역이다. 뉴잉글랜드는 미국 동부의 메인, 벨몬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1월 말 눈이 무릎 위까지 쌓이던 눈 폭풍 속에서 겨울을 느끼면서부터 녹음이 짙어진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 도착해서 배앓이와 함께 감기가 심했다. 시차 적응도 되기 전에 코로나에 감염된 줄로 알 정도였다. 물 때문에 생긴 배앓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이 좋다는 것을 먼저 말한다. 평소 수돗물을 끓여서 먹어도 되는 우리의 물과 비교하면, 이곳의 물은 음료수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시 당국의 안내문까지 공지되어있다. 이것은 내가 머무는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다. 덕분에 해외여행 촌놈이 적응력 떨어짐을 물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게 되었다(하하하).

다음은 이 지방의 맛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 미국 동부의 뉴잉글랜드에서 즐기는 것은 랍스터이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며 먹는 따끈한 랍스터 요리는 뉴잉글랜드에서 살면서 누리는 특권 중의 하나로써 한국에서라면 상상하지 못할 가격에 즐긴다고 보스턴 코리아 뉴스가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 음식 백과사전’에 따르면, 랍스터 롤은 1929년 초 코네티컷주 밀포드에 있는 Perry’s라는 레스토랑에서 뜨거운 요리로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 인기는 코네티컷 해안을 중심으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즐기게 되었다고 한다. 코네티컷에서는 따뜻하게 만든 샌드위치는 “랍스터 롤”이라고 하고, 차갑게 요리된 것은 “랍스터 샐러드 롤”이다.
1970년대부터 메인의 Red’s Eats와 같은 길거리 음식점에서는 다진 랍스터를 핫도그 빵에 넣어 뜨겁게 녹인 버터와 먹기 시작했다. 미국의 랍스터 롤은 메인주와 관련이 있지만, 다른 뉴잉글랜드주의 해산물 레스토랑과 랍스터 낚시가 흔한 동부 롱아일랜드에서도 흔하게 즐긴다. 대표적인 사이드메뉴는 감자 칩과 딜 피클이다. 통째로 쪄낸 랍스터, 여기에 감자튀김과 코슬로우(양배추샐러드)가 곁들여져 있기도 하다. 랍스터 롤, 클램 차우더, 후라이드클램(조개 튀김) 등이 인기 메뉴다. 스터프 튼 클램, 칵테일 새우, 랍스터 요리와 함께 식전 빵, 코울슬로, 감자튀김이 곁들여져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랍스터롤과 클램 차우더를 맛있게 즐겼다.
예전에 평택항 인근에서 꽃게요리를 먹어본 경험과 영덕게를 먹어 본 느낌을 살려 볼 때, 뉴잉글랜드의 랍스터롤도 맛있게 먹은 음식이다. 아직 많은 맛집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찾아 즐겨보겠다. 이렇게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행하는 동안 사람들의 표정과 움직임을 보면서 경험하지 못한 지역의 문화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자연이 부럽다. 자연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그중에서 미세먼지가 적은 선명한 공기의 질과 사람이 사는 공간의 미를 갖게 하는 나무에 대한 소감이다. 부럽다고 하면 승부에서 상대에게 지는 것이다. 그렇다. 미국 날씨든 한국 날씨든 다른 것은 없다. 그런데 대기를 이루는 공간의 투명도가 다르다. 이것이 부럽다. 우리보다 더 산업화하였어도 공기의 질이 다르다고 말하려는 거다. 구름이 낀 날은 구름도 선명하게 보인다. 맑은 날의 햇살은 더 뜨겁게 몸에 닿는다. 그 느낌의 차이다. 실내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즐길 때는 모른다. 문을 열고 문밖으로 나서면 싱그럽다.
시선을 멎게 하는 나무의 푸르름과 나무가 주는 그늘 공간이 아주 좋다. 아름드리나무가 많다. 동네 길을 산책하면서 한 번 안아보았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한다. 울창한 숲이 생활공간에 가까이 공존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다.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 자유분방하게 자라서 사회구성원으로 크게 한자리를 하는 큰 인격체처럼 보인다. 빡빡하게 모인 자리에서 자란 나무는 훌쩍훌쩍 커 올라있고 그 길이가 20~30m는 족히 넘어 보인다. 또 한가롭게 홀로 서 있는 나무는 자신의 모습을 뽐내듯 가지를 넓고 크게 키우고 있다. 지난겨울에는 앙상했던 가지들이 하지를 지나는 지금은 울창한 모습으로 큰 그늘을 즐기게 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소나무가 울창하게 위엄을 자랑한다. 태백산맥 줄기에 있는 금송이나 적송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소나무(pine tree)가 이루는 숲은 장관이다. 우리나라에서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소나무는 분재로 그 위용을 나타낸다면 이곳 보스턴에서 본 소나무는 자연군락을 형성하며 그 위용을 보여준다.
그때는 몰랐다. 이제는 들린다고 말하고 싶다. 행여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해도, 함께 할 수 있다고… 고향집 뒷곁에 미루나무가 냈던 소리가 들린다. 새벽녘 텃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잠을 깨우는 소리도 들려준다. 뭉게구름이 나무사이로 흘러 고향집으로 가는 소리도 들려준다. 나무사이로 지는 석양빛 빨간 노을이 그리운 얼굴들을 보여준다. 높이 솟은 나무의 소리들이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살아 온 곳에 대한 향수와 나를 성장시켜준 환경과 이웃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얼굴에 대한 고마움을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더불어 여행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어 다니는 독서다’라는 말이 이렇게 멋지게 다가올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