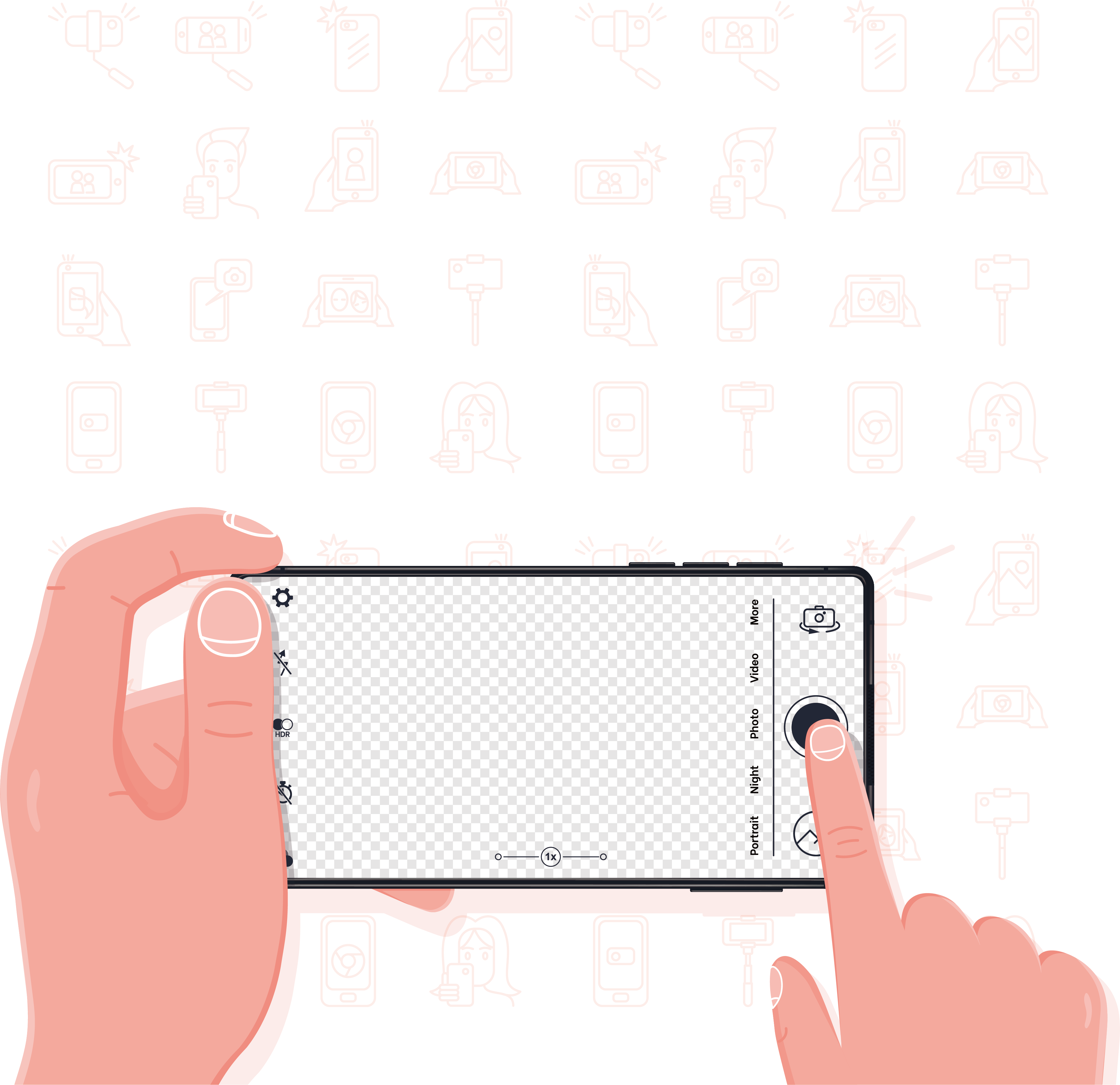- 응모기간: 1월 2일 (금) ~ 2월 20일 (금)
배경 음악이 재생 중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명산과 동고동락 하고 있는 산과 물아일체 경지의 고찰. 필자가 사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합천 해인사, 해남 미황사 그리고 부안의 내소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찰이 주는 마음의 여백에서 잠시 쉬어보시기를 바란다.
그중 부안 내변산에 자리한 내소사 여행기를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내소사를 간 기억은 100대 명산 여행을 하며 내변산 등산을 마친 후 들른, 너무 짧은 시간에 둘러본 기억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산행에 지쳤고 안내산악회가 그렇듯 산행 마감 시간에 쫓겨 수박 겉핥기로 둘러 본 내소사. 그러던 중 이대목동병원에 근무 중인 친구와 얘기 끝에 내변산과 내소사 얘기가 나와 의기투합하여 선뜻 이뤄진 여행이었다.
부안행
장마 때인지라 주말인데도 버스는 거의 비어 있다시피 했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 도착한 부안 터미널에는 누구 하나 기다리는 사람 없이 깊은 어둠과 긴 적막이 가득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는 한숨을 쉬며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담배를 피워 문다. 어디서 잘까? 저녁도 먹기 전인데. 준비 안 된 여행의 시작은 막막하기만 했다. 그래도 나보다 준비성이 있던 친구는 터미널 부근 숙소를 미리 생각해 놓았다. 그중 가까운 곳을 찾아냈고, 중년 사내 둘은 밤에 북극성을 좌표 삼아 걷는 여행자처럼 깊은 어둠 속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모텔 속으로 사라졌다.

여행지의 밤
여행의 첫날 밤은 항상 설레며 흥분이 된다. 처음 보는 복도와 침실 그리고 창. 퀘퀘한 냄새조차도 여행자들이 남겨 놓은 낙서처럼 정겹다. 사내 둘의 여행 첫날에 빠질 수 없는 술. 고속도로를 달려오며 밤길을 감상도 못하고 비축해 놓은 체력과 여행지의 신선함이 모든 감각을 깨우고 또 채운다. 빈 찬에 차려진 술상. 이런저런 얘기와 쌓여 가는 빈 병들. 시간은 늘 불공평하다. 즐거움에는 가혹하리만큼 빠른 화살처럼 날아 과녁에 꽂힌다. 자정이 훨씬 넘고 술병이 한쪽으로 모일 즈음, 내일 내변산에 오르기 위해 잠을 자야 한다. 얼마나 잤을까. 창밖에 빗소리가 들린다. 여행지에서 듣는 빗소리는 낭만적이지만, 내변산에 오를 아침이 걱정되는 새벽이다.
여행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는 비가 만만치 않다. 정상을 빠른 산길로 들어갔다가 나오려 했지만 이런 장맛비에는 산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진다. 따뜻한 옥수수를 사서 한입씩 베어 물고는 서로 산에 갈 수 있을까? 하며 묻는다. 그래 산은 나중에 시간 내서 오고 내소사에 가서 좋은 구경이나 하고 오자며 계획을 바꾸었다. 내소사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부안 터미널 안에는 체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끈적거리는 공기가 채워진다. 밤과 달리 낮의 터미널은 오가는 사람들과 서로 안부를 묻는 소리, 도착한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들로 생동감을 넘어 어수선한 분위기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우리도 가벼운 짐을 들고 새로운 여행지를 향해 떠난다.



내소사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내소사. 검은 아스팔트 위로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비가 내린다. 기름 바른 것처럼 반들반들 윤이 나는 아스팔트 양 옆 상가에서는 오랫동안 알아온 것처럼 스스럼없이 호객을 한다.
친구는 우산을 쓰고 기름 먹인 듯 반들반들한 길을 생각에 잠겨 앞서 걷는다. ‘능가산 내소사’라 적힌 일주문.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일주문. 해남 미황사 일주문을 가려면 도로를 따라 울울창창 나무들을 사열하듯 오르는 멋진 길을 지난다. 부안의 내소사 일주문을 지나자 즐비하게 쭉쭉 뻗은 전나무들이 푸른 터널을 만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절로 감탄을 내지른다.
비가 내려서일까. 전나무 냄새가 진하고 향긋하다. 전나무의 푸르른 사열을 향긋하게 끝내고 나면, 꿈에 볼까 무서운 사천왕이 지키는 천왕문을 지난다. 전각들이 소실된 자리인지 잘 모르겠으나 넓은 마당이 나오고, 천년이 넘은 당산나무는 사계절 중 푸르름으로 사바대중을 맞고 있다. 마당과 당산나무를 지나면, 불법(佛法)을 언어가 아닌 소리로 세상에 알리는 고려동종이 있는 보종각, 법종 법고 목어가 있는 범종각이 있다. 그 뒤로 채색은 세월의 뒤안으로 사라져 버린 2층 누각 봉래루가 나온다. 봉래루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내소사의 심장인 대웅보전을 볼 수 있다.
봉래루 누각에 올라 사계절 언제든 전나무 길을 바라본다면 그 곳이 극락이리라. 봉래루를 지나면 대웅보전이 정면에 보이고 좌측에는 무설당, 우측에는 설선당이 있다. 무설당(無說堂)!!! 이름 참 멋지지 않은가. 말하지 않고 부처의 법을 배우는 집. 묵언수행을 하며 부처의 길을 정진하는 곳. 수다스러운 나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경지다. 무설당을 마주하는 설선당은 부처의 길을 사람의 언어로 풀어내는 집. 특히 설선당의 멋스러움을 제대로 느끼려면 당산나무를 지나기 전 범종각과 함께 보이는 돌담 밑에서 바라보면 내소사의 또 하나의 멋스러움을 알 수 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창공을 날 듯 무설당과 설선당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말로 부처의 길을 배우는 길과 말없이 부처의 길을 깨닫는 것을 균형잡으며 정진하라는 의미인가 보다.

대웅보전 앞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삼층석탑이 있다. 세월의 흔적만큼 색도 바래고 모서리 부분도 부드럽게 무뎌져 있다. 대웅보전을 오르는 돌계단은 대충 쌓아 올린 듯 투박하고 정교한 멋은 없지만, 오랜 시간 고향을 지켜온 아버지의 손등을 보는 것 같아 정겹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대웅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울긋불긋한 화려한 단청은 지난 세월에 지워지고, 나무가 갖는 본연의 색으로 사바대중을 맞이하는 내소사 대웅보전.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불화에 대해서는 눈 뜬 장님인지라 눈여겨 보지도 못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격언이 천 번 만 번 맞는 말이다.
눈을 들어 대웅보전의 천정을 보면 일정한 격자 안에 연꽃 봉우리를 조각했고 좌우로 용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물고기를, 다른 하나는 여의주를 물고 있다. 대웅보전 창호의 창살에는 연꽃, 해바라기, 국화꽃 문양을 새겨 놓아 이채롭다. 창살의 단청은 세월과 함께 퇴색되어 사라지고, 바람이 지나갔을 창살에 옛 목공의 손길이 드러난다. 여유롭게 창살에 손을 대고 세월의 흔적을 느껴보시라.
대웅보전을 돌아가면 예쁜 돌계단이 보이고 돌계단 옆에 나무 한그루가 있어 참으로 예뻐 보이는 길이 보인다. 삼성각으로 오르는 길이다. 삼성각 안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다. 낯익은 사진 하나와 옆으로 사진 둘. 맨 우측에는 대한민국 산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산악그랜드슬램(지구 3극점, 히말라야 14좌 완등, 세계 7 대륙 최고봉 완등)을 이룬 박영석 산악대장. 2011년 10월 안나푸르나 남벽의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등반 도중 실종되었다. 아마 옆 사진 둘은 같이 올랐던 대원의 사진일 것이다. 삼성각에 바라보니 내소사가 비에 단아하게 젖고 있다.

부안의 맛, 백합조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맛 아닌가? ‘부안’하면 백합조개와 백합죽. 이름이 꽤 난 계화식당에 가서 백합정식을 시켰다. 백합조개전으로 허기를 살짝 달랜 후 백합조개구이를 여는 순간 품고 있던 바다 내음을 입안 가득 넣어 본다. 콩나물에 버무려진 백합찜. 입안에 모든 잡내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백합탕. 참기름을 살짝 둘러 고소하면서 여백의 미가 남는 백합죽.
짧게 마무리한 남도의 부안 여행. 비가 그치고 나니 칠월의 햇살이 만만치 않게 뜨겁다. 몸은 칠월의 부안거리에서 축축 늘어져 가고 터미널까지 걷는 거리에서 피곤이 밀려왔다. 서울에는 저녁이나 되어야 도착할테고, 서로의 안식처로 헤어질테고, 월요일 아침이 지나고 다시 주말이 오는 금요일이 돼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릴 때 대책 없이 떠난 여행을 추억에서 꺼내 달콤하게 기억하겠지. 2022년 5월에 이 글을 정리하며 방사선사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벗님들~~~ 어디든지 떠나시죠!!!